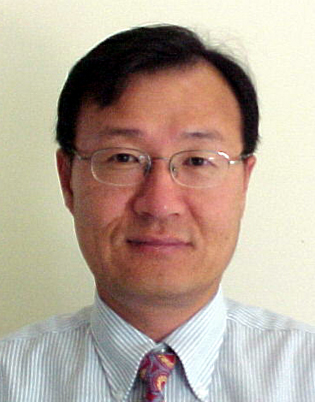 |
||
| ▲ 윤국한 재미언론인 | ||
미 행정부 당국자들에의 접근이 워낙 어렵다 보니 한국 특파원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레 그 이유에 대한 추측도 없지 않았고 그 중 하나는 ‘전과론’이었다. 1990년대 중반 북-미 간 핵 협상과 관련한 한국 언론의 추측보도와 오보 등에 미 행정부 당국자들이 데인 결과 아예 기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당시 익명의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해 하루가 머다고 보도된 한국 언론의 기사들 중에는 미국쪽 협상관계자들을 아연실색하게 한 내용들이 적지 않았다.
사실과 다른 보도, 비보도를 전제로 한 간담회 내용을 그대로 게재하는 등의 무책임한 보도들은 그렇잖아도 위태로운 북-미 간 협상을 더욱 어렵게 했다. 한 예로 1994년 7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자 한국의 한 방송은 강석주 등 북한쪽 협상대표들이 김일성 직계여서 모두 교체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물론 사실이 아니었다. 그 직후 있은 브리핑에서 미국쪽 대변인은 몹시 화가 난 표정으로 이 보도를 언급하면서 ‘outrageous(터무니 없다)’라고 했다는 얘기를 당시 취재현장에 있던 한 선배로부터 전해 들었다.
지난 일을 장황하게 거론한 이유는 최근 논란을 빚고 있는 국정홍보처의 ‘정책홍보 업무처리 기준’ 때문이다. 청와대나 국정홍보처 입장에서는 사사건건 정부 정책을 비판하고 심지어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없는 듯한 일부 언론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리란 생각이 든다. 실제로 청와대 등 정부쪽 관계자들의 언론을 향한 말과 글에서는 적대감마저 엿보인다.
그렇지만 각 부처에 공문을 보내 ‘정부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거나 현저하게 사실과 다른 보도를 지속하는 언론에 대해 특별회견, 기고, 협찬 등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주관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너무 드러날 뿐더러 마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사실 언론 때문에 정부가 잘 하고 있는데도 잘못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 혹은 언론의 보도로 점수를 따겠다는 발상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다. 그런데 현 정부는 언론보도에 늘 과도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
앞서 예로 든 미 정부 당국자들을 만나기가 어려운 것이 실제로 한국 언론의 오보와 관련이 있는 것이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들은 이와 관련해 어떤 문서도 남긴 것이 없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그들이 내외신을 상대로 매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더 이상 물어볼 것이 없을 정도로 상세하게 현안에 대해 설명하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기자를 만날 일이 없으리란 추측을 보태게 됐다.
한겨레신문 창간 뒤 첫 출입기자로 청와대를 취재하게 됐을 때의 일이다. 노태우 대통령의 6공화국 정부 시절이었는데, 당시 청와대 당국자들은 한겨레의 비판성을 익히 아는지라 껄끄러워하고 또 긴장도 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그 시절에 참 많은 비판기사를 쓰기도 했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한겨레를 기피하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간을 내어 정부의 각종 정책과 발표 등에 대해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했던 것을 기억한다. 출입기자인 나 자신 뿐 아니라 편집국 간부들과도 적극 만나 배경설명을 하고 보도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등으로 애를 썼다. 지금은 그 때와는 매체의 수 등 언론환경이 다르다고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정부가 언론을 상대로 해야 할 일은 그 때나 지금이나 조금도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윤국한 재미언론인·전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의 전체기사 보기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