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하대에서 벌어진 사망 사건에서 또다시 언론의 고질적 문제가 드러났다. 발견 당시 피해자의 모습을 선정적으로 묘사하고, 가해자의 성별은 밝히지 않으면서 피해자의 성별만을 강조한 기사 제목들이 쏟아진 것이다. ‘육감’ ‘몸매’ ‘꽃뱀’ ‘김여사’ 등의 차별·비하적인 단어로 여성을 표현하는 언론의 실태를 데이터로 분석한 기자들이 있다. 10개 전국일간지 10년 치 기사 헤드라인 763만8139건을 분석한 경향신문 ‘헤드라인 속의 OO녀’ 취재팀 기자들은 기사, 인터랙티브 콘텐츠 ‘노처녀가 사라졌다’를 통해 그 10년의 변화상을 기록했다.

‘헤드라인 속의 OO녀’는 데이터저널리즘팀 다이브, 여성서사아카이브 플랫, 디지털뉴스편집팀 기자 4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만든 기획이다. 신지혜 디지털뉴스편집팀 기자는 “편집팀에 있다 보니 타 언론사들의 제목을 많이 보게 되는데 여성 신체 위주의 헤드라인에 환멸을 느끼던 차였다. 마침 데이터저널리즘팀에서 지원자 공모를 올려 참여하게 됐다”며 “기사 제목을 보고 느끼는 불편한 감정들이 있는데 이번 작업으로 어떤 매체가, 얼마나 많이 비하 표현을 쓰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그 심각성을 알릴 수 있어서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기획에 대한 아이디어는 지난 2월 나왔지만, 보도가 나오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데이터가 워낙 방대했고, 여성을 지칭하는 헤드라인을 구별해 내는 것도 기술적으로 구현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래도 없는 일로 하기엔 너무나 아까운 아이템이었다. 데이터저널리즘팀이 이번 작업을 위해 외부 전문가 도움까지 받아 처음으로 ‘형태소 분석’ AI 머신러닝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유다.
이수민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는 “이전에는 기술적으로 만들 수 없으면 할 수 없이 ‘쳐내기’도 했는데 이번엔 일단은 해보자, 정 안되면 배워서라도 하자는 마인드로 임했다”며 “이번 작업을 계기로 데이터 테크닉이 한 단계 뛰었다고 본다. AI 모델도 경험한 건데 다른 기획에서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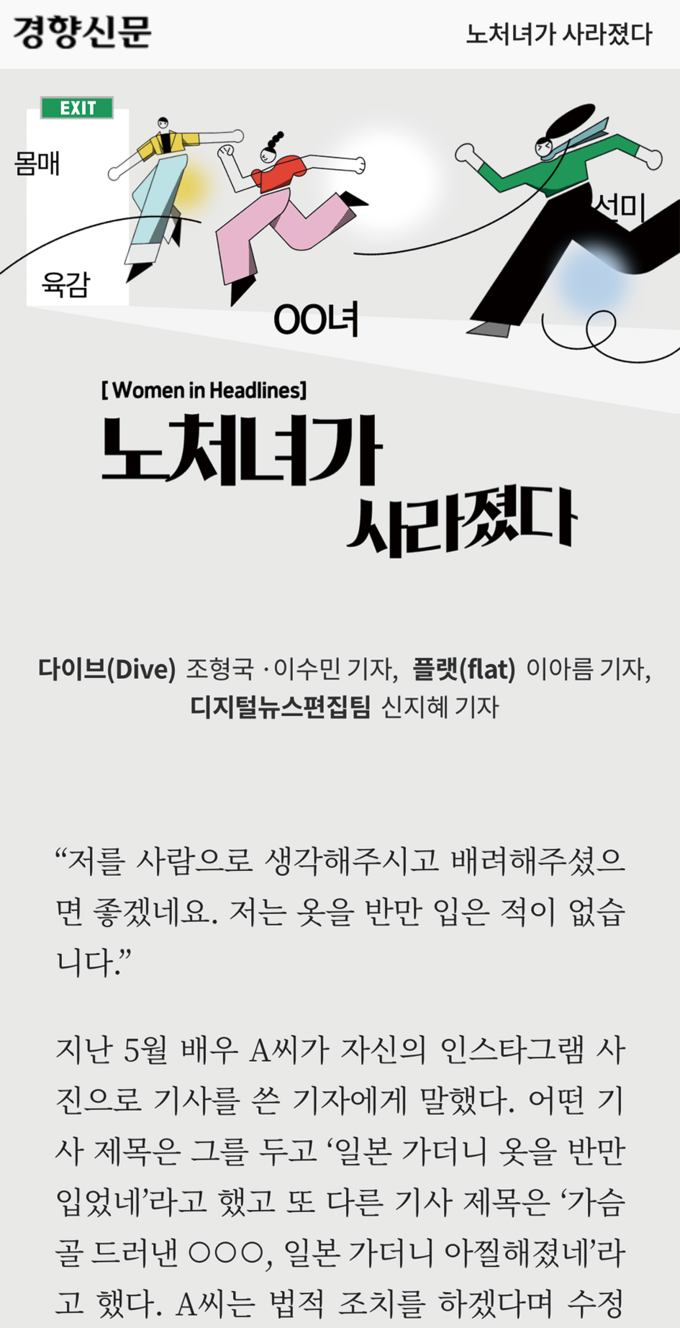
이번 기획은 독자들이 의문을 갖는 “언론이 조금이라도 변화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작업이었다. 데이터를 통해 기자들이 확인한 사실은 “굉장히 더디게 변화하고 있지만, 여성 차별적·비하적 표현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기자들이 자사는 물론 언론사들의 ‘흑역사’를 하나하나 담아내면서도 ‘노처녀’라는 단어가 2020년 4월을 마지막으로 제목에서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됐고, 베이글이 ‘베이글녀’에서 점차 진정한 빵의 의미로 쓰이고 있는 등의 희망적인 내용을 풀어낸 이유다.
“언론사 전수조사 분석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기획이 될 수도 있는데 조금 더 독자들이 가깝게 느꼈으면 했어요. 현장에서 고민도 당연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살릴 수 있게 노력을 많이 했죠. 인터랙티브 메인 이미지도 밝아 보이게, 차별적인 단어들에 탈출하는 모습으로 그린 것도 그런 의도였어요.”(이아름 뉴콘텐츠팀(플랫) 기자)
기자들은 기사 작성을 넘어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유통할지도 고민했다. 다음 시리즈로 이어지는 링크에 넷플릭스와 같은 방식으로 기사를 소개하고, 가독성을 해치면 그래프를 넣는 대신, 기사엔 과감히 그 부분을 지우는 작업을 시도했다.
“취재하고 글 쓰면 내 할 일 다 끝났다고 생각하곤 했는데 플랫, 디지털뉴스편집팀 기자들과 같이 일을 해보니 콘텐츠를 독자 친화적으로 만들어 내놓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뉴스 편집 자체가 취재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는 일들도 있었죠. 무엇보다 그동안 다이브가 대장동 이슈, 공직자 재산 공개와 같은 기획들을 내놨었는데, 젠더 이슈에서도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영역을 넓힌 것 같아 의미가 남다르다고 봅니다.”(조형국 데이터저널리즘팀 기자)
Copyright @2004 한국기자협회. All rights reserved.





